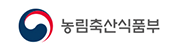|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한옥의 매력

누가 봐주거나 말거나
커다란 입술 벌리고 피었다가, 뚝 <나태주 시인의 능소화中>
문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 자라난 능소화(陵宵花) 줄기와 꽃으로 만들어진 문. 두 번째는 능소화 문을 지나자 삐걱대는 소리마저 정겨운 나무 대문.
한옥은 그리움이다. 누가 봐주거나 말거나 소박하게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자리 한 켠에 지키고 있을 법한 그런 집이 한옥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집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의 한옥 수는 현재 약 8만9000동으로 전체 주택의 0.6%에 불과하다. 이는 한옥의 경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나뉘어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건축 비용도 일반 주택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또 주기적인 유지보수와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나마도 한옥마을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한옥은 전체에서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정(情)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서울의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한옥의 매력을 느낄 기회가 생겼다.
서울 북촌에는 내국인도 머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있다. 최근에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한옥에서 쉽게 자는 소셜민박이 가능해졌다.
이들 한옥 중 한 곳인 ‘참하우스’를 찾아갔다. 국내 집공유 분야 벤처 기업인 코자자(www.kozaza.com)를 통해 집 선택부터 예약까지 쉽게 할 수 있었다.남향으로 위치한 참하우스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그마한 마당이 나타났다. 그리고 안채가 마당을 디귿자로 포근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북촌에 있는 한옥은 대부분 옹기종기 모여 있어, 담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들이 묘한 정취를 자아낸다. 이 곳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길을 걷다 보면 골목 주변에 이름 모를 들풀과 과수나무가 가득하다.
북촌에는 생각과 달리 한옥 뿐만 아니라, 양옥집들도 제법 많았다. 그러나 한옥과 양옥집 모두 마당이 있고 그 위에 갖가지 꽃과 과수나무가 있었다.
북촌의 매력은 한옥이 모여 있어서라기 보다는 동네 자체가 주는 아늑함, 그리고 꽃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의 여유가 함께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참하우스는 기단은 돌을 사용하고 기둥과 서까래, 문, 대청바닥 등은 나무를 사용했다. 벽은 흙 위에 나무를 덧대 만들었으며, 천연 나무 창에는 한지를 발랐다. 마루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방이 있고, 부엌과 화장실은 마루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구조였다. 방은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대청과 마당은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였다.
전통 한옥의 경우 화장실을 집 밖에 두지만, 참하우스는 지난해 한 차례 대대적인 수리를 해 게스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 수리를 했지만, 다행히 옛 멋은 그대로 살아있다. 문살과 한지로 만든 방문과 창문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고 바람도 잘 통한다. 담은 적당한 높이로 둘러서 있어 집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다.

지붕의 선과 담, 그리고 문살의 무늬에서는 주인의 마음씨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장마의 끝자락인 7월 중순 매우 더운 날이었지만 방과 방 사이에 통하는 바람 그리고 마루 등 열린 공간으로 덥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참하우스 주인인 유형건씨는 “이곳에 살면서 달라진 점은 어두워지면 자고, 날이 밝으면 일찍 깬다는 점이다”며 “더워도 에어컨을 안켜게 되는 등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춰 살게 됐다”고 말했다.
한옥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 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의 세세한 디테일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지붕에 켜켜이 쌓인 먹색 기와는 시간의 흔적을 나타내려 군데 군데 깨졌지만 조악하지 않았고, 그 위에 낮게 쌓인 이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름에 멋을 낸다고 말해준다.
김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