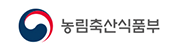|
강남 아파트 전세 놓고 한옥마을 주민으로 변신한 주부 2명의 ‘희로애락’
자가용으로 5분이면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할 수 있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한강변에서 조깅을 즐겼다. 그들이 강북 한옥으로 이사 가려 할 때 친구나 부모님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왜? 불편하게 무슨 한옥이니?”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강남 아파트 값이 꺾이자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묻는다. “한옥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살 만해?”
하늘이 보이는 대청마루와 마당은 ‘한옥살이’의 자잘한 불편함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지난해 말 강남 아파트를 떠나 북촌과 서촌으로 이사해온 전(前) ‘강남 아줌마’ 두 사람으로부터 한옥살이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들어봤다.
○ 희(喜), 한옥으로 알게 된 비우는 삶
김미경 씨(42)와 윤정예 씨(60)는 전형적 강남 주부였다. 김 씨는 결혼 후 줄곧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살았고, 윤정예 씨도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 빌라촌을 맴돌았다.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나면 차를 몰고 마트나 백화점에 들르는 게 일상이었다.
한옥에 온 뒤로 달라졌다. 아파트처럼 맘껏 사서 쟁여 둘 공간이 없고, 쓰레기도 정해진 날에만 버릴 수 있다보니 알아서 소비를 조절하게 됐다.
윤 씨는 “강남에 살 때는 4∼5일에 한 번씩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사서 꾸역꾸역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며 “요즘은 열흘에 한 번 장을 보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걸어 다녀서 요즘은 한 달 주유비가 고작 5만∼6만 원이다.
가구도 확 줄였다. 김 씨는 “한옥에는 가구를 늘어놓을 수 없으니까 모두 친정과 친지들에게 나눠줘 버렸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 노(努), 한옥 매력보다 집값에만 관심 갖다니…
최근 집을 구경하러 오는 친지들이 부쩍 늘었다. 한옥 장만 요령을 물어보기도 한다. 이 가운데는 ‘일찍 샀으니 돈 좀 벌었을 것’이라는 삐딱한 시선도 적지 않다.
김 씨는 8년 전 우연히 삼청동에 들렀다가 강남과 전혀 다른 한옥의 매력에 빠졌다. 2년 가까이 한옥 마을을 헤집고 다니다 2006년 가회동 집을 장만했다. 그는 “한옥살이의 가치와 매력보다 투자 목적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한옥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일대인 북촌 한옥마을에는 3.3m²당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한옥이 수두룩하다.
김 씨는 “친구들이 ‘나도 강남 아파트 팔고 한옥으로 갈까’라고 물으면 ‘이젠 팔아도 올 수 없다’고 말해줄 정도로 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자 한옥을 처분하고 떠나는 이들도 이따금 있다”고 귀띔했다.
윤 씨는 “본인이 즐기지 못하면 한옥에 살기 어렵다”며 투자 목적의 한옥 거주를 경계했다.
○ 애(哀), 강남 집값 떨어져도 미련 없다
이들은 아직 강남의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잠원동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했고, 윤 씨는 전세 수요자도 찾지 못해 비워둔 상태다.
강남 집값 하락은 진행형이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졸이지 않는다. 김 씨는 “돌아갈 마음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때 불안할 텐데 이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나 미련이 전혀 없다”며 “찾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강남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게 저나 아이들이나 스트레스였어요. 강남만큼 살기 편한 곳도 드물 테지만 이제 불편한 한옥이 좋네요.”
○ 락(樂), 열린 세상 사니 지병 천식도 잠잠
한옥에 와 수다꾼으로 변신한 이들. 열린 대문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외국인, 골목길 편의점 아저씨, 옆집 이웃들…. 이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윤 씨도 스스로가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양재동에 살 때 집 문을 열어두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웃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활기가 넘치고 지병이던 천식도 가라앉았어요. 제 나이에 참 즐거운 변화죠.”
장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