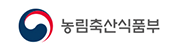|
“개성 한옥촌 새단장… 제2의 북촌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건축가 황두진 이색 제안 관심
지난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네잎클로바)를 출간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개성 관광길에 찍은 개성 한옥촌.
전쟁의 포화를 피해 살아남았지만 보존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신은미 씨 제공
건축가 황두진(50)은 현대 건축가지만 한옥과도 인연이 깊다.
서울 행당동 작은 한옥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건축과 재학 시절엔 북촌 가회동 한옥마을을 실측했으며, 미국 예일대 유학 후 서울 서촌에 건축사사무소를 차린 뒤 10년간 북촌을 중심으로 한옥 11채를 짓거나 고쳤다. 한옥의 현대화를 고민해 오던 그는 2007년 동아일보 아파트 연재물에서 ‘한옥 아파트’를 제안했는데 이후 한옥 아파트 짓기가 붐을 이뤘다.
그런 그가 북한 관광객이 찍어 온 개성 구도심의 한옥촌 사진을 그냥 보아 넘길 리 없었다. 개성은 6·25전쟁의 폭격을 피해 갔고 이후 체제의 특성상 개발의 광풍도 비껴갔다. 그래서 쇠락했으되 살아남은 한반도 최대 한옥촌이 사진 속에 있었다.
“제가 작업해 온 북촌과 다르지 않더군요. 개성 가서 고쳐 보라고 하면 북촌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저만한 한옥촌이 남아 있으니 대목장 소목장 와공 목공 같은 한옥 건축 인력도 있을 것이다. 이 인력을 활용해 개성 공단에 치목(治木·재목을 다듬고 손질함)공장을 세우고 한옥 부품을 생산한다면, 그래서 육로로 전국에 조립식 한옥을 판매한다면….
건축가 황두진은 ‘한옥이 돌아왔다’(공간사)에서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서 한옥의 보편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
하성욱 작가 제공
황 소장은 한옥의 현대화에 북한이라는 화두를 더해 수년간 고민해 온 끝에 개성에 한옥 생산기지를 만드는 대북 사업안을 완성했다. 남북한 전문가가 함께 개성 한옥촌을 개·보수해 서울 북촌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한옥 체험 시설로 조성하고, 개성공단에 치목공장을 세운 뒤 현지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조립식 한옥을 생산한다는 내용. 한옥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정부에 북한 방문과 대북사업 승인 신청도 낼 계획이다.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비용이 양옥의 1.5배나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데다 국산 육송을 벌목해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인건비가 저렴한 개성 한옥 인력으로 공장에서 치목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한국산 소나무와 비슷하면서도 벌판에서 자라 벌목과 수송이 쉬운 시베리아산 소나무를 쓴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황 소장의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남한에서는 이런 한옥 짓기가 가능하다. 한옥 설계도를 그려 개성 치목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는 육로로 수송해 온 시베리아산 소나무를 도면대로 깎아 내려 보낸다. 남한의 건축 현장에서는 이 부품들을 조립해 마무리한다.
“한옥을 싼 가격에 지으려면 한옥의 산업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승인을 얻는다면 남한의 한옥 전문가들이 현지 한옥촌의 실측 조사부터 해야겠지요. 개성공단에 한옥 건축 인력을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두어야 하고요.”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시작하더라도 끝을 볼 수 있을까. 가늠하기 어려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는 수년 전부터 동료 건축가 및 전문가들과 북한의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구글어스로 북한의 시가지를 샅샅이 들여다보며 사업 계획을 다듬고 있다.
“건축가로서 한반도로 시야를 넓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우선 북한 사회가 열리도록 돕고, 경제적인 동시에 정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죠. 고려의 수도였던 천년고도 개성의 문화유산과 개성 공단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개성은 세계적인 목조건축의 전통을 자랑하는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